이창동이 말하는 ‘이창동의 영화’
올해 전주국제영화제는 이창동 감독을 조명하는 특별전 ‘이창동: 보이지 않는 것의 진실’을 진행했다. 프랑스 알랭 마자르 감독이 만든 이창동 감독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월드 프리미어로 상영하고, 이창동 감독의 최신 단편 <심장소리>를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 또한 <초록물고기>와 <오아시스>의 디지털 버전도 처음 선보였다. 이창동 감독도 영화제가 열리는 동안 관객과 함께 극장에서 관람했다. 그가 기자회견을 통해 최초로 여는 특별전의 의미를 전했다.

영화제에서 처음으로 특별전을 여는 소감이 궁금합니다.
2년여의 팬데믹 기간에 극장에는 관객이 줄었고, 영화제도 비대면으로 진행해왔죠. 이번 전주국제영화제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팬데믹 이후 정상적인 대면 영화제로 처음 열렸습니다. 제 특별전이 영화제에 활기를 불어넣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특별전의 제목이 ‘보이지 않는 것의 진실’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지은 이름은 아닙니다(웃음). 영화는 보여주는 매체죠. 실은 보여주는 매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제 영화는 시나리오 단계부터 촬영, 편집 후반 작업까지도 일관되게 보여주지 않는 것을 관객이 느끼게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것이 제 영화의 특징이죠. 그것을 이해하고 붙인 제목이 아닌가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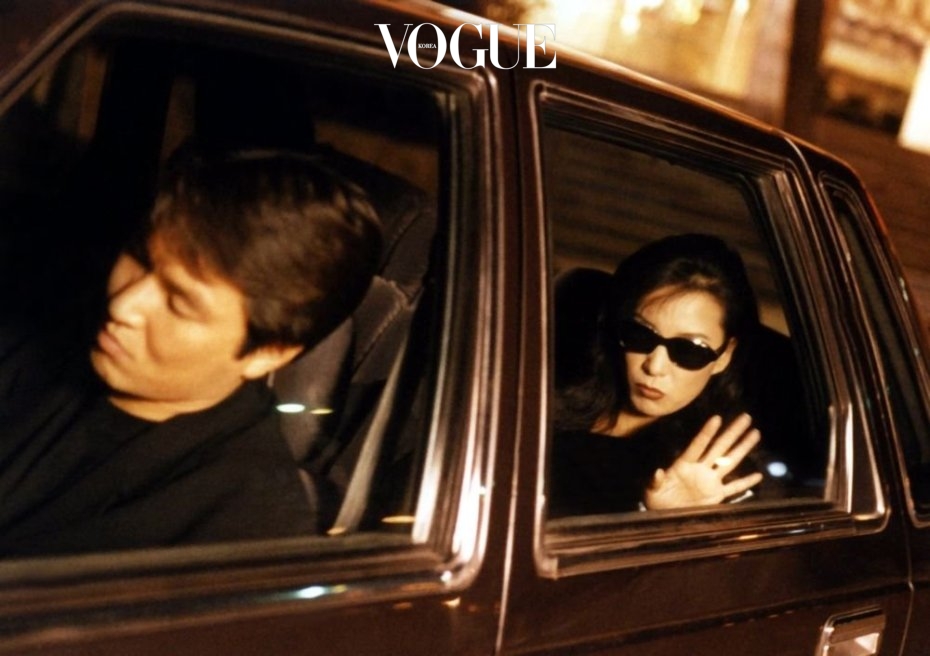
1997년 개봉한 영화 <초록물고기>를 4K 디지털 리마스터링했다.
올해로 25주년인데, 그 시간을 압축한다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벌써 25년이 됐네요(웃음). 그동안 많은 영화를 만들었다고 할 순 없지만, 1997년 <초록물고기>로 처음 데뷔했을 때, 수치상으로 한국 영화 산업이 최저인 시기는 아니었어요. 그 전인 1993~1994년이 수치상 최저였죠. 하지만 영화인들이 실감하기에는 1997년이 바닥이었어요. 바닥이란 말은 그다음에 오른다는 뜻이죠. 1997년 설 대목에 <초록물고기>를 개봉하던 날, 바로 한 주 전에 개봉한 다른 작품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관객이 두 명뿐이어서 환불해주고 상영하지 않았다고요. 당시엔 개봉할 때 영화인들이 모여서 축하해주는 미풍양속이 있었는데(웃음), 그 소식을 듣던 영화인들의 표정이 잊히지 않습니다. 남 일이 아니라 모두의 일이니까요. <초록물고기>를 가지고 밴쿠버영화제에 갔을 때만 해도 아무도 한국 영화에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은 부산영화제가 그 역할을 하지만 당시엔 밴쿠버영화제가 아시아 영화를 서구에 소개해주는 창구였거든요. 그럼에도 한국 영화는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걸 체감하고 한국 영화가 앞으로 주목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발전을 이루어서 세계인이 놀라는 작품이 많이 나옵니다. 한국 영화 특별전을 구성하지 못하면 영화제로서 능력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만큼 한국 영화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한국 영화의 활력을 이루는 데 저도 한 귀퉁이에서 노력했다고 할 수 있죠.
한국 영화의 어떤 점이 세계인을 사로잡았을까요?
그런 질문은 외국에 나가서도 받습니다. 나름대로 생각해보니 다양함 같아요. 한국의 영화감독을 떠올리면 다 다르거든요. 사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일본 영화, 중국 영화 등 떠올리면 뭉뚱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한국 영화는 색깔과 성격이 다 다릅니다. 또 하나는 역동성 같습니다. 영화에서 느껴지는 다이내믹한 힘. 영화뿐 아니라 K-팝, 드라마 등 다른 장르도 다른 나라 콘텐츠가 갖지 못하는 다이내믹한 힘이 느껴져요. 어쩌면 한국 사람이 가진 정서적인 강렬한 힘일 수도 있고요. 한국인이 살아온 삶의 역사, 궤적, 경험, 현재도 계속되는 문제를 뚫고 나오면서 생긴 생명력이랄까요. 과거에는 쉽게 한이라고 했어요. 요즘엔 한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죠. 그만큼 부정적인 것을 넘어서 긍정적인 총체적 힘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세계 관객이 다르게 받아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큐멘터리 <이창동: 아이러니의 예술>의 한 장면.
알랭 마자르 감독의 다큐멘터리 <이창동: 아이러니의 예술>에서는 이창동 감독의 영화 속 장소를 다시 찾습니다. 그곳들을 다시 봤을 때 어땠나요?
이상하게도 많이 변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별로 변하지 않을 곳을 찾았는지도 모르죠. <초록물고기>를 찍은 곳은 창고나 공단이 되면서 더 삭막해졌어요. <초록물고기>라는 영화 자체가 일산 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전에 살던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는 영화인데, 더 황폐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당신의 작품을 ‘리얼리즘의 탈리얼리즘’이라 말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제 영화나 소설을 두고 흔히 리얼리즘이라 얘기하죠. 제가 작품 활동을 시작한 1980년대는 정치 사회 문제, 현실의 압박과 부조리가 강한 시대였기에 그것이 작가로서 본질적인 고민이 되었고, 다른 분야의 작가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시대적 상황 때문에 만들어진 작가 세계가 아닐까 싶어요. 영화를 해오면서 그 정체성을 계속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 제 영화에서는 가공의 현실이 아니라 진짜 같은 현실이라는 느낌을 강력히 받으셔서, 리얼리즘이다, 다큐 같다는 얘기를 하시고, 또 그래서 불편하다는 관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나 분명하고 단순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영화를 만들지는 않아요. 그렇게 쉽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큰 힘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죠. 영화가 끝나면서 쉬운 카타르시스와 메시지를 주고 끝나는 영화도 있지만, 그것은 관객이 극장 문을 나서는 순간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오래 관객에게 질문이 남고, 자기 삶과 영화가 연결됨을 느끼게 하고 싶어요. 그런 면에서 특정 현실의 이야기일지라도 각자에게 보편적인 의미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보편적 의미로 연결된다는 것은 어떤 계급이나 환경에 있는 관객이든 그걸 넘어서서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 질문, 보편적 의미로 확장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리얼리즘이지만 현실을 넘어선 어떤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심장소리>도 우울증을 앓는 엄마를 둔 아이의 불안, 걱정, 엄마를 구하겠다는 원초적 욕망, 이런 것을 다루고 있지만 그 우울증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우울증을 가진 사람의 고통이랄까, 그런 것을 관객이 공유하길 바랍니다. 엄마를 살려야 한다는 아이의 욕망, 생명에 대한 갈구, 그것이 아이가 뛰는 심장이겠죠. 그 아이의 감정과 그 아이가 느끼는 심장 소리를 관객이 함께 느끼길 바랐습니다. 그런 것이 현실이나 국경, 계급을 뛰어넘는 보편적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창동 감독의 단편 <심장소리>.
단편 신작 <심장소리>를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세계 최초로 상영하는 소감이 궁금합니다. 전주에서 세계 최초로 상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저를 비롯한 몇몇 다른 나라의 감독에게 우울증이라는 주제로 단편영화를 의뢰해, 하나의 옴니버스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다른 감독들이 정해진 뒤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가장 먼저 완성했죠. 아직 만들지 않은 감독도 있습니다. 제가 원래 영화 만드는 속도가 느린 편인데 이상하게 제가 먼저 만들었어요(웃음). 실제로 <심장소리>는 2020년 늦가을과 초겨울 사이에 촬영했고, CG 등의 후반 작업이 시간을 끌어서 지난해 1월에 완성했습니다. 전주영화제 특별전을 한다고 해서 우선 내 작품이라도 먼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단편이라도 저를 비롯한 스태프나 배우들도 최선을 다했기에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국제영화제를 찾은 이창동 감독.
OTT 이후 영화 산업이 더 위축되고, 팬데믹 이후에도 관객이 극장을 덜 찾게 될 거란 관측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혹시 OTT 영화를 만들 의향이 있나요?
말 그대로 엔데믹이 된다 해도, 극장에서 상영되는 영화의 운명은 저뿐 아니라 모든 영화인,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의 초미의 관심사지만,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어요. 다만 지금 OTT에서 쉽게 쉽게 쇼핑해서 보는 영화, 들어가서 보고 아니면 빠져나오고 지루하면 빨려 돌려버리는 관람으로 소비하는 영화가 아니라, 영화 매체가 원래 가진 본질, 시간의 흐름과 함께 영화 세계에 나를 맡기고 느끼고 경험하는 영화, 그런 영화는 살아남아야만 합니다. 관객이 아무리 OTT 관람 태도에 길들여진다 해도 영화의 본질을 저버리지 않을 거라 희망하고 믿습니다. 다른 어떤 장르보다도 영화가 타인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든 어디 멀리 있는 사람이든, 그들을 가깝게 느끼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매체는 영화기에, 이 영화 매체의 본질적인 힘을 인류가 사라지게 할 리 없죠. 다른 존재와 공감하게 하는 매체의 미래는 살아 있어야만 하고 그럴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OTT의 제안을 여러 번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지 않는 이유는 OTT라서가 아니라, OTT를 하든 영화를 하든 ‘내가 할 만한 이야기’라는 판단이 서야 하는데, 그런 작품을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차기작이 궁금합니다.
항상 준비하고 고민하고 계획하고 있어요(웃음). 뭐랄까요, 숙성하다가 숙성이 안되어서 유보하거나 접는 과정을 거칩니다. 지금도 당연히 시나리오 작업 중인 작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했다가 공수표가 될 수 있기에(웃음) 말씀 못 드리는 점 이해 바랍니다.
- 포토
- 전주국제영화제
추천기사
인기기사
지금 인기 있는 뷰티 기사
PEOPLE NOW
지금, 보그가 주목하는 인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