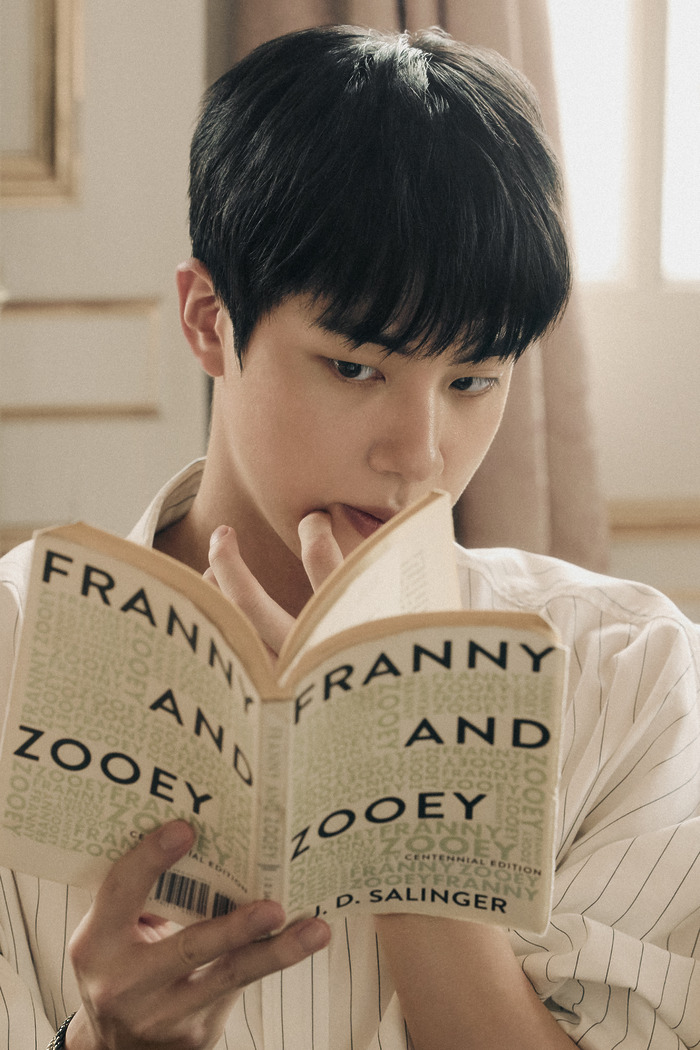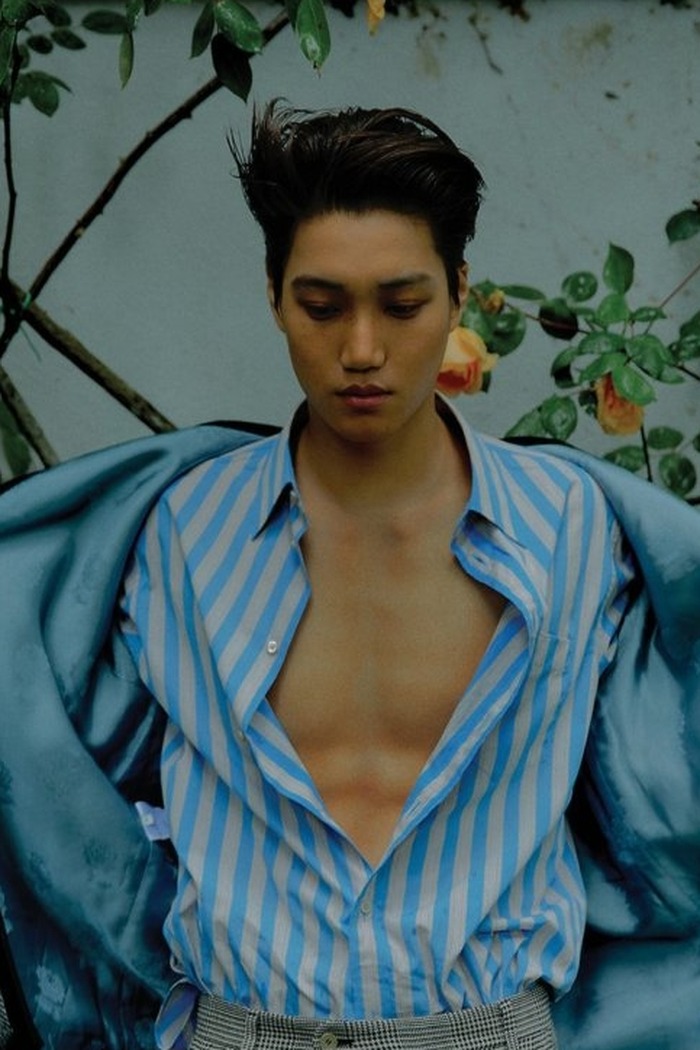영화 ‘원더랜드’ 속 영상통화 서비스명은 왜 원더랜드일까?

*이 글에는 영화 <원더랜드>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영화 <원더랜드>는 세상을 떠났거나, 그에 준하는 사람을 가상현실 캐릭터로 복원해주는 서비스에 관한 이야기다. 극 중 이 서비스의 이름은 ‘원더랜드’다. 망자의 보호자, 또는 생전의 망자가 가상현실 속 모습을 미리 설정할 수 있다. 가상현실 속 그들은 인공지능을 통해 전화를 걸어오고, 행동하고, 기억하고, 심지어 추론한다. 프로그래밍된 인격이 반복 학습으로 프로그래밍을 넘어설 수 있다는 상상력은 그리 새로운 게 아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의 목소리와 모습을 복원하는 기술도 마찬가지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도 미국의 한 시한부 환자가 300개의 문장을 녹음해 자신이 사망한 후에도 아내가 자신의 목소리와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는 뉴스가 보도됐다. 이런 뉴스까지 보고 나니 문득 영화 속 서비스의 이름이 왜 ‘원더랜드(Wonderland)’일까 궁금해졌다.
‘원더랜드’는 한 끗 차이로 여러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단어다. 동화의 나라, 상상의 나라, 이상한 나라… 영화 속 서비스는 죽은 가족이나 연인의 외형뿐 아니라 말투, 성격까지 복원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살아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매월 상당한 비용을 지불할 것이다.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그리움 때문이다. 더 정확히 설명하자면, 그리움을 충족시킬 만큼 이 서비스를 통해 만나는 대상이 너무 현실적이고 생생해서 어딘가에 아직도 살아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 서비스는 이름에서부터 ‘상상’ 또는 ‘이상한’이라는 의미를 전한다. 이용자들의 믿음과 착각이 지속되어야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믿지 말라’는 뜻을 내보이는 서비스명이라니.


그럼에도 꼭 ‘원더랜드’로 명명해야 했다면, 아마도 이 서비스의 창시자는 이용자들이 세상을 떠난 사람과의 관계에 깊이 빠지지 않았으면 했을 것이다. 영화 속 이용자들이 겪는 갈등은 모두 ‘과몰입’이 초래한 것이다. 죽음을 앞둔 여자는 남겨진 어린 딸을 위해 ‘원더랜드’ 서비스를 신청한다. 여자는 죽었지만, 그녀의 아이는 머나먼 나라에서 고고학자로 일하는 엄마와 매일 영상통화를 한다. 아이는 점점 엄마와의 통화에 과몰입한다. 하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죽은 여자의 엄마는 과몰입할 수 없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여자는 식물인간이 된 남자 친구와 소통하고 싶어 서비스를 신청한다. 그녀는 거의 모든 일상을 스마트폰 속 ‘남친’과 함께한다. 그런데 실제 남자 친구가 깨어난다. 그는 예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다. 여자는 원더랜드 속 남자 친구와 달리 실재하는 남자 친구에게 몰입할 수 없어 괴리감을 느낀다. 죽은 손자가 그리워 서비스를 신청한 할머니의 과몰입은 더 비극적이다. 할머니는 가상의 손자가 부리는 응석을 모두 받아준다. 이 가상의 손자는 자가발전을 해서 할머니에게 비싼 자동차와 옷 등을 요구한다. 이미 과몰입해버린 할머니는 가상의 손자에게 선물할 가상 아이템을 구입하느라 잠도 못 자고 일한다. 창시자는 정식 서비스로 출시하기 전 이런 과몰입이 초래할 수 있는 일을 직접 경험했거나 예상했을 것이다. 그래서 ‘당신의 죽은 가족, 연인은 어디까지나 가상 세계에 있는 가상의 인물입니다’라는 경고를 서비스명에 담고 싶지 않았을까?


이 영화를 보면 시나리오를 쓴 입장에서도 ‘원더랜드’란 이름을 붙인 이유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다. <원더랜드>의 이야기는 결국 ‘원더랜드’에 과몰입했던 이용자들이 이 서비스를 하나의 구독 서비스로 인정하는 과정이다. 영화는 죽은 이를 그리워하는 것, 그리워하다 못해 소통하는 것이 정말 행복하기만 할까, 하는 질문을 던진다. 그러고는 죽은 이에 대한 그리움이 내 생활을 갉아먹을 만큼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마무리한다. 끝부분에 이르러서야 서비스명의 진짜 의미와 영화 제목이 함께 완성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영화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다. 내가 이 서비스의 마케팅 담당자였다면 ‘원더랜드’란 이름을 끝까지 반대했을 것이다. 장례식장에는 고인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죄책감을 자극해 더 비싼 품목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업자들이 있다. 게임에서도 과몰입한 이용자들이 더 좋은 아이템을 손에 넣기 위해 ‘현질’을 하도록 설계한다. 수익성을 생각할 때 ‘원더랜드’는 분명 이 서비스에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다.
추천기사
인기기사
지금 인기 있는 뷰티 기사
PEOPLE NOW
지금, 보그가 주목하는 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