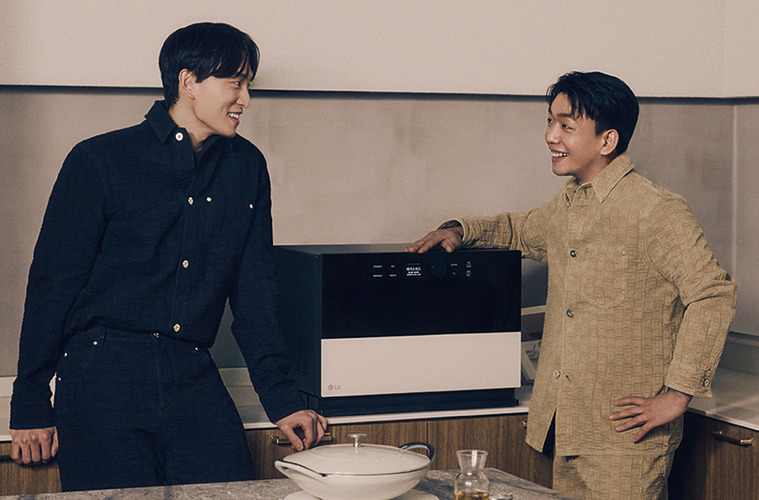특이점이 오는 순간 25%_2024 유행 통신
재난과 위기가 계속 발생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시대지만, 일상은 계속된다.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향유하고 나눈다. 건축, 출판, 영화, 연극, 여행, 미술, 사회운동, 스포츠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업계의 흐름 혹은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이야기한다. 삶을 즐기고 더 낫게 바꾸려는 의지가 구현한 판에서 함께 놀고 싶어진다. 이 기사는 유행을 따르자는 의미가 아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가볍게 관찰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취향 혹은 재밋거리를 발견할 수 있길 바란다.

“여자도 사람이외다!”(<이혼 고백서>(1934)) 한국 최초의 여성 화가이자 문학가, 여성해방론자인 나혜석(1896~1948)은 전 생애에 걸쳐 이렇게 외쳤다. 1918년 발표한 소설 <경희>에는 이런 문장이 나온다. “경희도 사람이다. 그다음에는 여자다. 그러면 여자라는 것보다 먼저 사람이다.” ‘여자도 (남성과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당연한 명제는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누군가는 이렇게 항변할지도 모르겠다.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을 앞질렀고, 결혼과 출산이 선택이 된 요즘 세상에 대체 어디가 ‘불평등’하냐”고. 정말 그럴까.
최근 언론계와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 중에는 단연 남성 기자들의 ‘단톡방 성희롱’이 있었다. 국회를 취재하는 남성 기자 3명이 단톡방에서 최소 8명 이상의 여성 기자와 정치인에 대해 성희롱을 한 것이 <미디어오늘>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수위는 옮겨 적기도 어려울 정도다. 여성 기자들은 주로 성기 등 신체 부위를 지칭하는 단어로 불렸다. 그들의 눈에 동료는 ‘사람’이었을까.
여성 기자 풋살 선수들도 ‘사람’이 아니기는 마찬가지였다. 한국기자협회 여성 기자 풋살 대회는 지난해 막 첫걸음을 뗐다. 남성 기자들의 축구 대회가 1972년 이래로 49차례 열리는 동안 여성 기자는 그저 응원 군단에 머물렀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기자협회는 여성 기자들이 뜨겁게 땀 흘리고 팀워크를 다질 수 있는 풋살 대회를 열기 시작했다. 겨우 2회째인 올해 무려 29개 팀(언론사)이 참여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무게 추를 조금이라도 옮기려 최선을 다해 뛰는 동안, 가해 남성들은 여성 기자들의 사진을 찍어 외모를 품평하고 성희롱했다.
“우리는 여성이 아니라 기자로 취재 현장을 뛰었다. 필드 위에서도 한 명의 선수로서 운동장을 뛰었다. 그러나 원치 않는 상황에서 우리의 몸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대상화되었다. 우리가 필드에서 최선을 다해 땀 흘려 뛰는 동안 응원할 거라 믿었던 동료 기자가 이런 저열한 생각을 갖고, 표현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울 만큼 충격적이다.” 성희롱 피해를 입은 여성 기자들은 성적 불쾌감과 분노를 느끼는 데 머물지 않았다. 보도 이후 하루 만에 소속 회사와 상관없이 여성 기자들은 일사불란하게 소통했다. 공동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연대하기 위해서였다. 가까스로 시작된 여성 기자 풋살 대회가 위축되지 않기를, 그리하여 더 많은 여성 후배가 운동장을 누비기를 바라는 마음도 성명서에 담겼다. 이들은 “건강하고 즐거운 축제의 장으로 지켜내기 위해” 관련 주체가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밖에 한국여성기자협회도 처벌을 촉구하고 2차 피해 방지를 당부하는 성명을 냈다.
놀랍게도 결과는 속전속결이었다. 가해자 3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됐다. 1명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해임됐고, 나머지 2명은 사표를 썼지만 회사가 수리하지 않은 채 해고하거나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성희롱에 비교적 관대한 한국 사회, 그것도 남성 중심 문화가 지배적인 언론계에서는 무척 이례적인 결과였다. 물론 2017년, 2019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언론인이 다수 참여한 단톡방과 오픈 채팅방에서 여성 기자를 성희롱하거나, 불법 촬영물이 공유되었다. 당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가해자 다수는 여전히 언론에 몸담고 있다.
무엇이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만들어낸 걸까. 핵심은 목소리 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성 기자가 늘었다는 거다. 최근 현장에서는 어디를 가든 스니커즈를 신고 발에 땀 나도록 누비는 여성 기자를 쉽게 볼 수 있다. 수십 년 전 여성 기자에 허락된 영역이 문화부 등의 특정 부서에 국한된 것과 달리, 요즘은 대통령실, 국방부, 검찰 등 분야를 막론하고 어디에서나 여성 기자가 활약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주요 일간지 기준 여성 기자의 비율은 드디어 30%를 넘었다.
데이먼 센톨라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교수 연구 팀에 따르면 한 집단의 소수자 비율이 25%를 넘어선 순간, 비로소 그들의 목소리가 제도권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 여성의 목소리가 모래알로 흩어지지 않고 주류 세계에 균열을 내는 힘을 갖기 위해서는 이른바 25%에 해당하는 ‘쪽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여초 분야라 불리는 직군을 제외한다면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조직에서 여성의 비율이 3분의 1을 넘기는 경우는 여전히 드물다(여초 직군이나 고시 등 시험 성적이 중요한 특정 분야는 예외다). 여성 교수, 여성 검사, 공공 기관 및 민간 기업 여성 관리자, 여성 기초자치단체장 등등··· 한 자릿수에서 고작해야 10% 남짓이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부터 실격이다. 지난 5월 임기를 시작한 22대 국회에서 여성 의원은 60명.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비율로 따지면 20% 정도다. 인구의 절반인 여성의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쪽수’에 한참 못 미친다. 공직선거법은 여성 30% 공천을 명문화하고 있지만, 거대 양당의 여성 공천율은 10%대에 불과했다.
저출생, 여성 대상 폭력 등 풀어야 할 성차별·성평등 이슈가 산적했지만, 정치로 풀어나갈 동력이 없어 여성의 삶은 좀처럼 제도권 안에서 좋아지지 못하고 있다. 몇 안 되는 여성 의원들은 ‘페미 공격’을 받을까 봐 최대한 여성 의제는 총대 메지 않으려는 게 최근 여의도 정계에서 감지되는 분위기다. 의회를 차지한 여성이 75명(전체의 25%)만 되었어도 상황은 지금과 확연히 다르지 않을까. 여성 의원이 아니라 그냥 의원으로 존재할 수 있다면 말이다. “25%에 도달하는 단 한 사람만으로 흐름이 바뀐다.” 센톨라 교수가 국내 한 인터뷰에서 25%라는 숫자를 그토록 강조한 이유다. ‘여성도 사람’이라는 당연한 사실이 불변의 명제가 되기 위한 티핑 포인트는 딱 25%다. 여성의 비율이 4분의 1을 넘어서는 순간 변화가 시작된다. 언론계에서 다시 한번 입증된 이 가설이 ‘여자도 사람’이라는 100년 전 나혜석이 품은 소망의 실현을 한 걸음 앞당겼다.(VK)
관련기사
-

뷰 포인트
내가 전부인 시대의 책 읽기_2024 유행 통신
2024.08.05by 김나랑, 류가영
-

뷰 포인트
시로 저항하는 최정예 군단_2024 유행 통신
2024.08.05by 김나랑, 류가영
-

뷰 포인트
연극이라는 기후 위기 비상 행동_2024 유행 통신
2024.08.05by 김나랑, 류가영
-

뷰 포인트
무용계의 RT와 시야 전환_2024 유행 통신
2024.08.05by 김나랑, 류가영
-

뷰 포인트
도시와 건축의 이인삼각 달리기_2024 유행 통신
2024.08.05by 김나랑, 류가영
-

뷰 포인트
자동차의 사라진 계기판_2024 유행 통신
2024.08.06by 김나랑, 류가영
-

뷰 포인트
K-팝의 힙합 디폴트_2024 유행 통신
2024.08.06by 김나랑, 류가영
-

뷰 포인트
연상호라는 장르_2024 유행 통신
2024.08.06by 김나랑, 류가영
-

뷰 포인트
가장 창의적인 자가 복제만이 살아남는다_2024 유행 통신
2024.08.06by 김나랑, 류가영
-

뷰 포인트
진짜 테킬라의 시대_2024 유행 통신
2024.08.06by 김나랑, 류가영
-

뷰 포인트
학교로 돌아가지 않는 여행자들_2024 유행 통신
2024.08.06by 김나랑, 류가영
-

뷰 포인트
여자는 야구의 미래다_2024 유행 통신
2024.08.06by 김나랑, 류가영
-

뷰 포인트
기후 각성과 SF적 상상력_2024 유행 통신
2024.08.06by 김나랑, 류가영
- 글
- 이혜미(<한국일보> 젠더 뉴스레터 ‘허스펙티브’ 기자)
- 사진
- Getty Images
추천기사
인기기사
지금 인기 있는 뷰티 기사
PEOPLE NOW
지금, 보그가 주목하는 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