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LY ME TO THE MOON 지난해 첫 번째 ‘보그 리더’ 프로젝트에 참여한 천문학자 심채경은 특유의 따뜻한 목소리로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발렌시아가 봄/여름 컬렉션과 함께 <보그> 카메라 앞에 섰다. 파랗게 물든 달을 배경으로, 빨간 드레스에 ‘로데오(Rodeo)’ 가방을 들고서.

SPACE ODYSSEY “패션에 대한 첫 기억은 유년 시절 골판지에 그린 룩을 가위로 오려 할머니의 식탁에서 패션쇼를 하던 순간입니다.” 3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뎀나(Demna)는 양쪽으로 늘어선 앤티크한 식탁으로 런웨이를 만든 이번 쇼를 통해 ‘관점이 있는 패션’에 찬사를 표했다.

DON’T LOOK UP 거대한 600mm 리치-크레티앙식 반사망원경 앞에서 벨트 장식이 달린 길쭉한 형태의 ‘벨 에어(Bel Air)’ 숄더백을 클러치처럼 손에 쥔 심채경의 모습이 이색적이다.

THE ASTRONOMER 뒷면을 코르셋처럼 엮어 착용하는 독특한 벨벳 드레스 차림의 심채경 박사가 ‘로데오’ 가방을 든 채 천체관측실 한가운데 서 있다. 광택이 있는 엠보싱 가죽에 군데군데 벗겨진 자국을 더하고 해진 운동화 끈을 참처럼 활용한 디자인이 재미있다.

SHINING STAR 어깨가 우뚝 솟은 재킷, 몸에 꼭 맞는 실루엣, 웅장한 비율. 뎀나 특유의 스트리트 감성을 주입한 탈권위적 럭셔리 하우스가 선보이는 의상은 언제나 기발한 방식으로 몰입감을 선사한다.

GUARDIANS OF THE GALAXY “패션은 엉망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망가져야 해요.” 모든 면에서 흠잡을 데 없는 세련된 모습은 뎀나가 추구하는 패션이 아니다. 두려움이 기반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트렌치 코트에 해체주의 기법을 적용해 드레스처럼 연출한 블랙 의상처럼.

CAN’T FIGHT THE MOONLIGHT 빈티지하게 연출한 메탈 장식이 특징인 ‘로데오’ 가방의 미니 버전. 찬란하게 쏟아지는 별빛 사이에서 한층 더 돋보인다.

MY UNIVERSE “천문학자의 경우 ‘사회의 부름에는 대체로 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심채경 박사의 에세이에 등장하는 문장. 오늘은 <보그>와 함께 패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렇게 기회가 주어질 때 대중과 소통하는 것 또한 부수적이면서도 중요한 임무다.” 의상과 액세서리는 발렌시아가(Balenciaga).

“우주의 가장 깊은 어둠에 묻힌 모든 것들 중에 어둠 속엔 수십, 수백억의 예외들. 그리고 난 그 예외를 파고드는 사람입니다.” 19세기 여성 천문학자 헨리에타 레빗은 자신의 직업을 이렇게 설명한다. 늘 그 자리에 있는 달·별과 함께 보내는 천문학자에게 무언가 특별함이 있다면 차이를 감지하는 눈과 그 다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일 것이다. 시립서울천문대에서 만난 심채경 박사는 광나루역으로 오는 길에 이곳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다고 했다. “‘흥사단’이 운영하는 천문대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1913년 도산 안창호 선생이 설립한 그 ‘흥사단’이다. 100여 년 전 독립운동의 역사와 21세기 우주과학이 패션지의 뷰파인더 앞에서 교차하고 있다니!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대상을 달리 보게 함으로써 국면을 전환시킨다. 천문학자의 역할 또한 마찬가지다.
한국천문연구원의 연구책임자로서 그의 주요 일과는 ‘다누리’가 보내오는 수천 개의 자료를 매일 대조해 작은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다. 2022년 발사된 한국 최초의 달 궤도 탐사선 다누리는 여전히 순항 중이다. 심채경 박사 역시 다누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원래 임무는 1년이었는데 생각보다 상태가 너무 좋아 기간을 2년 더 연장했죠. 기계도 잘 작동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 미션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고민이에요.” 또 다른 미션은 달 착륙선에 실어 보낼 관측 기기를 정하는 연구 기획. 우리나라는 2032년 전남 고흥의 나로우주센터에서 달 착륙선 발사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이미 우주기술 선진국은 민간 우주탐사선까지 연이어 성공시키며 새로운 대항해 시대를 예고했다. 무인 달 착륙선 ‘블루 고스트’가 예술품을 달로 보내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의 시조 8편을 싣고 가면서 화제가 됐다. “우리는 아직 문화 얘기까진 가지 못했죠. 다누리호의 이름도 전에는 ‘한국형 시험용 달 궤도선’이었어요. 굉장히 딱딱하죠? 나중엔 달 착륙선 이름도 짓게 될 텐데 아무래도 과학자들은 멋진 이름을 붙이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달은 근사한 이름이 많다. 인류 최초로 발을 디딘 ‘고요의 바다’, 달의 북동쪽 사분면에 위치한 ‘위난의 바다’, 북서부의 ‘맑음의 바다’, 그리고 ‘비의 바다’, ‘풍요의 바다’··· 오래전 유럽인들이 지은 이 고전적이고 낭만적인 명칭은 달의 신비로움을 가중시킨다. “맞아요. 과학이 아직 철학이던 시대에 붙인 이름이죠. 아마 저를 비롯한 달 과학자들에겐 고요의 바다가 가장 친숙할 거예요. 아폴로 11호가 착륙하기도 했고, 고요의 바다를 기준점 삼아 여러 연구가 진행되거든요. 최근엔 조선 시대 학자의 이름을 딴 크레이터(Crater)도 생겼어요. ‘남병철 크레이터’라고, 다누리호의 자료로 연구하던 분들이 그렇게 지었어요.”
심채경 박사는 반복적인 업무의 ‘지루한 즐거움’을 말한다. “사실 지난 몇 년간 거의 비슷한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일하는 분야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게 변하지는 않거든요.” 덕분에 아직도 신입의 마음이라며 웃는 그는 ‘먹고사는 일’을 신성하게 여긴다. 특히 인상적인 건 ‘제자리걸음도 걸음’이라는 부분. “무언가를 계속하고 있다는 데 의의를 둡니다. 실패해보지 않으면 달까지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것과 같거든요.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계속 실패하는 과정을 보지만 우리는 실패라고 부르지 않아요. A가 안되면 다음엔 B, 그것도 안되면 고쳐서 C를 하고, 그런 반복이 우리의 일이기도 해요.”
뭐가 될지는 몰라도 최선을 다해 시도하는 것. 답을 찾지 못해도 과정 자체가 다음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 그건 ‘왜 달에 가고자 하는지’, 지구에서 38만km나 떨어진 작은 위성에 관한 연구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나사(NASA)에서는 요즘 이런 얘길 자주 해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일을 한다.’ 당장은 별 도움이 안 되죠. 이건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주탐사는 말도 안 되게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루고자 하기에 거기서 하이엔드가 나오거든요. 결국은 그게 지구상의 여러 분야에 퍼져나갈 거고요. 과학자가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문화 예술인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할 거예요.” 과학은 때로 낙관적인 동화 같다. 오래전부터 자연과 우주는 인간에게 존재의 의미를 묻고, 인간을 꿈꾸게 해왔다. 비록 허황될지라도 누군가는 그 꿈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다.
성실한 보통 사람들처럼 그는 천천히, 그리고 쉼 없이 나아간다. 크고 작은 결실과 숱한 상실, 그로 인한 변화 속에서 오늘도 어김없이 해는 지고 달은 뜰 것이다. (V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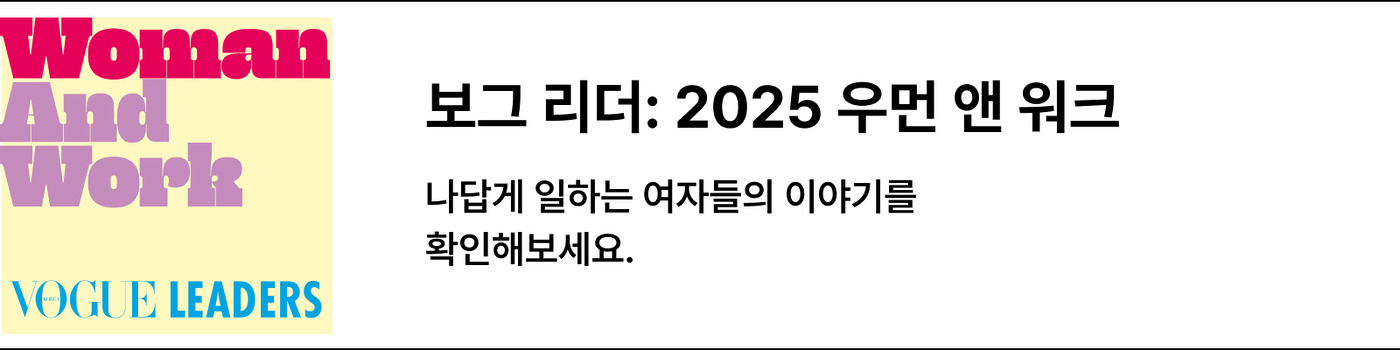
- 포토그래퍼
- 윤송이
- 패션 에디터
- 김다혜
- 피처 디렉터
- 김나랑
- 글
- 이미혜(미술 칼럼니스트)
- 헤어
- 임안나
- 메이크업
- 안세영
- 로케이션
- 시립서울천문대
- SPONSORED BY
- BALENCIAGA
추천기사
-

셀러브리티 스타일
프라다 커스텀 룩 입고 코첼라 무대 오른 엔하이픈
2025.04.14by 오기쁨
-

패션 아이템
청바지부터 치마까지, 어디에나 어울리는 '그때 그 시절' 샌들!
2025.04.16by 안건호
-

패션 아이템
입기만 해도 봄기운 물씬 느껴질 지금 이 계절의 블라우스 5
2025.04.14by 안건호, Tatiana Ojea
-

라이프
7년을 견딘 우정의 단단함
2025.03.20by 오기쁨
-

패션 뉴스
헤일리 비버, 저스틴의 브랜드 'SKYLRK' 위해 나섰다
2025.04.16by 오기쁨
-

아트
임윤찬과 함께하는 통영국제음악제
2025.03.28by 김나랑
인기기사
지금 인기 있는 뷰티 기사
PEOPLE NOW
지금, 보그가 주목하는 인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