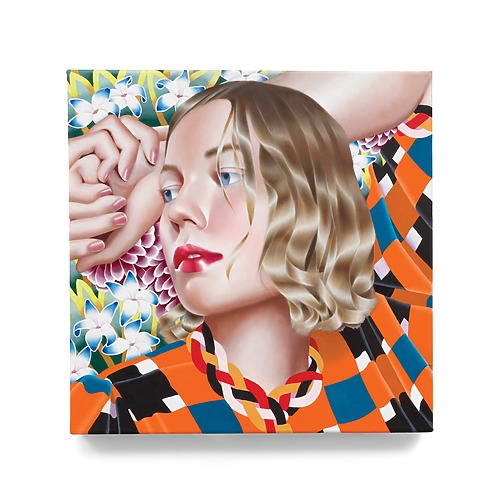괴물, 마녀, 도깨비의 꿈
영화 비평을 하는 나는 종종 영화제에서 영화 상영 후 갖는 ‘관객과의 대화’의 진행자, 일명 모더레이터로 일하곤 한다. 올해도 그 역할로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여러 편의 영화와 만났다. 국내외 영화를 보고 감독, 배우, 스태프, 관객과 함께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언제나 긴장과 기대가 있다. 그 가운데 홍지영 감독의 신작 <이 파도를 이 물결을 돌려줄게>(2023) 첫 공개의 순간을 함께했다. 드라마 중심의 기승전결이 확실한 영화에 익숙한 관객에게는 실험 영화로 분류되는 영화 문법이 다소 낯설고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영화의 세계가 이토록 다양할 수 있다는 데 마음을 열어본다면, 감독 고유의 감각과 세계를 향한 입장이 비교적 선연하게 다가올 것이다. 영화가 말하듯, ‘이것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 혹은 ‘세계에 대한 하나의 전망’이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영화를 향한 애정 표현이기도 하다.

어떤 사랑인가. 고요한 가운데 파도 소리가 들려온다. 서로를 사랑하는 영진과 재연을 두고 사람들은 ‘괴물’, ‘마녀’, ‘도깨비’라고 수군댈지도 모른다.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 괴물, 마녀, 도깨비는 함께 살수록 가난해지고 초라하게 늙어간다. 그런 운명에 지쳐가던 그녀들은 함께 잠들기 위해 바닷가로 떠난다. 두 사람을 둘러싼 이 몇 가지 지점은 흔히 대사라고 하는 방식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자막과 내레이션, 비디오와 사운드 푸티지, 사진 이미지 등으로 전해진다. 이질적인 요소들이 교차하고 접붙여지고 때론 어긋나는데 도리어 이러한 방식이 고유의 질감이 되고 이 영화의 세계가 되는 게 매력이다. 영화는 다수의 시선이나 주류의 방법론으로는 좀처럼 가시화되지 않는 존재, 어쩌면 비존재라 불리는 존재와 그 상태를 스크린으로 불러낸다. 이를테면 유령의 형상들, 또 이를테면 매끈하거나 뽀얗지만은 않은 옷의 밴드 자국이 그대로 있는 여성의 몸, 그 몸들이 나누는 애무 같은 것이다. 그뿐인가. 지극히 통속적으로 보이는 장면부터 실험성이 강한 이미지까지 한데 이어진다. 나아가 이 영화를 찍고 있는 이들과 영화 속 또 다른 영화를 찍고 있는 이들이 이어지기도 한다.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이곳에 있는, 존재하는 것들을 불러내기. 잇기. 만나게 하기. 마치 영화 콜라주처럼 말이다.
이 실험을 가능하게 한 하나의 텍스트가 있다. 미국의 여성 시인 에이드리언 리치의 시집 <공통 언어를 향한 꿈>(2020, 민음사)과 그에 수록된 시 ‘분열’이다.
‘나는 분열의 고통 분열을 창조한 자
당신에게서 당신의 연인을 지운 자는
시간도 거리도 아닌 바로 나
이별이 나를 불러낸 것이 아니라 내가
이별이다 그러니 기억하라
나는 당신과 떨어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
나는 이렇게 주어지는 것들 사랑과 행동 사이
분열을 거부한다 나는 의미 없이
고통을 겪지 않기로 그녀를 이용하지 않기로 한다
나는 이번만은 내 모든 지성을 다하여
사랑하기로 한다’
-‘분열’ 中

영화에 내레이션으로 낭독되는 ‘분열’이라는 시뿐만 아니라 이 영화는 전반적으로 에이드리언 리치가 쓴 시의 영향 아래 있다. 1929년 미국에서 태어난 시인은 1951년 첫 작품집 <세상의 변화>로 남성 중심의 문단에 이름을 알렸다.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세 아들을 낳았고 남편과 함께 베트남전쟁 반대 운동과 인권 활동을 했지만, 본격적으로 제 목소리를 내는 길로 나아간 데는 레즈비언으로서 성 정체성의 발견이 있었다. 그리고 페미니즘 운동과 여성의 언어를 발굴하는 글쓰기에 몰두하며 인생을 보냈다. 그녀의 시는 여성의 삶을 주목하고, 여성의 언어를 끄집어 올리고, 지금 이곳의 여성과 지난 세월의 여성, 다가올 여성의 시간을 잇는 여성 공통의 언어를 향한 오랜 꿈이라 평가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들여다봐야 해
우리의 삶을 향해, 남자들이 말하려 하지 않는,
말할 수 없는 여자들의 부재를—문명이라 불리는
아직 발굴되지 않은 이 구멍, 이 번역 행위, 이 반쪽 세상’
-‘스물한 편의 사랑 시’ 中 두 번째 시
그녀의 시 세계에서 분열은 연결됨의 전제 위에 있고 분열과 동시에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언어다. 연결되기 위해 분열하고 분열됨을 인정해야만 연결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잠에서조차, 다른 목소리를 내고,
우리 육체는, 매우 흡사하지만, 아주 다르다
그리고 우리의 혈관을 통과하며 메아리치는 과거는
다른 언어, 다른 의미들로 채워져 있어—
비록 우리가 공유하는 세계의 어떤 연대기 안에
그것이 새로운 의미로 기록될 수 있어도
우리는 같은 성의 두 연인이었고,
우리는 한 세대의 두 여성이었다‘
-‘스물한 편의 사랑 시’ 中 열두 번째 시
<이 파도를 이 물결을 돌려줄게>는 바로 이런 시인의 시상과 시선과 긴밀히 이어져 있다. 이것이야말로 영화가 서두에서 말한 ‘세계에 대한 하나의 전망’이기도 하다. 게다가 영화는 비디오 푸티지, 선명도가 떨어지는 화면, 이글거리고 지글거리는 쇼트를 통해 디지털화되기 이전의 비디오 영화, 모든 게 고르고 반질거리는 매끈한 화면이 아니라 거칠고 울퉁불퉁한 상태 그대로의 것을 현재와 접속시킨다. 마치 영화라는 매체, 물질, 재료 그 자체를 향한 꿈의 반영처럼 말이다. 치고 부서지길 반복하는 파도와 물결을 두고 누군가는 실패의 운동이라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파도를 이 물결을 돌려줄게>는 허물어지길 자처하는, 포기를 모르는 파도와 물결을 두고 ‘찬란한 실패’라 한다. 또 부서져도 좋다. 괴물, 마녀, 도깨비, 그리고 영화는 그렇게 찬란하게 실패를 거듭할 것이므로. 과거에도, 지금도, 다음에도 계속해서.
최신기사
- 포토
- Courtesy Photos, Pexels
추천기사
인기기사
지금 인기 있는 뷰티 기사
PEOPLE NOW
지금, 보그가 주목하는 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