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의 개는 시간을 저버리지 않으며
‘요 며칠 신기한 경험을 한 게 있나요?’ 누군가 묻는다면,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아마도 나만의 경험은 아니며 꽤 많은 이들이 이미 비슷한 일을 겪어본 적 있지 않을까 싶다. 소설과 영화라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하는 두 세계가 어느 순간 머릿속에서 이상하고 신비롭게 접속하는 경험 말이다. 그럴 때면 불가사의하게만 느껴지던 이 세계가 잠시 내게 빈틈을 내주는 것 같아 반갑고, 세계의 비밀에 조금 가까이 다가간 것 같아 설레기도 한다. 그 감각을 놓치고 싶지 않아 어떻게든 써두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 우연히 읽게 된 소설이 이전에 봤던 영화를 떠올리게 하는 순간이 대표적이다. 그저 우연일까. 수많은 것들 가운데 그 소설, 그 영화를 선택하게 된 건 어쩌면 알게 모르게 축적돼온 내 안의 경험과 관심의 촉수 때문은 아닐까. 그것의 자연스러운 발로가 아닐까. 그러니까 실은 우발과 우연의 주체 사이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약동하는 묘한 힘이 작동하는 게 아닐까.

최근 읽은 소설 가운데 이 재미난 경험을 안겨준 건 이 지면을 통해 소개한 적 있는 박솔뫼의 <극동의 여자 친구들>(위즈덤하우스, 2023)이다. 나는 아직 그 소설의 여진 속에 있다. 소설을 읽는 내내 소설 속 중부시장과 을지로 일대가 머릿속에 그려졌다. 주인공이 길을 걷다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움직임 연구회 중부지구’ 하며 그곳으로 찾아가 움직임 연습을 해보는 장면 같은 것도 ‘움직임 연구’를 둘러싼 개인적 관심 때문인지 더 가까이 느껴졌다. 분명 이것은 소설인데 영화를 볼 때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활동 같다고 해야 할까. 그렇게 느끼게 된 데는 박솔뫼의 소설이 인물의 구체적인 성격 묘사나 서사 전개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들의 상태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상황이든, 환경이든, 시간이든 계속 변모해가는 상태를 그리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던 길, 그 길 위에서 만나게 될 누군가의 얼굴이 정형화되거나 고정돼 있지 않고, 전에 본 적 없는 다르고 낯선 길과 얼굴로 다가오는 느낌이기도 하다. ‘세계가 갑자기 새로운 방식으로 드러나는 현상’(<지금은 대체 어떤 세계인가>, 주디스 버틀러, 창비, 2023)처럼(이 역시 이 지면에 소개한 또 다른 책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연결의 감각이다).
소설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런 현상의 출현을 목도하던 나는 지난 3월 세상을 떠난 이강현 감독의 영화 <얼굴들>(2017)을 자연스럽게 떠올렸다. <극동의 여자 친구들>을 읽을 무렵, 이강현의 영화를 다시 볼 일이 있었다. 박솔뫼의 소설에도, 이강현의 영화에도 등장하는 저 ‘얼굴들’이 선명한 듯 흐릿하게,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게 어른대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소설 속 길과 강주의 움직임, 동선, 상태가 영화 속 길과 혜진(김새벽)의 그것과 알 수 없는 생의 신비처럼 접속하는 듯했다. 소설도 영화도 어딘가로 수렴하거나 목적지에 도착하려 들기보다는 느슨하게 이어지길, 계속 이동하고 움직이길, 그리하여 어딘가에서 우리가 아주 잠깐 우연히 스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듯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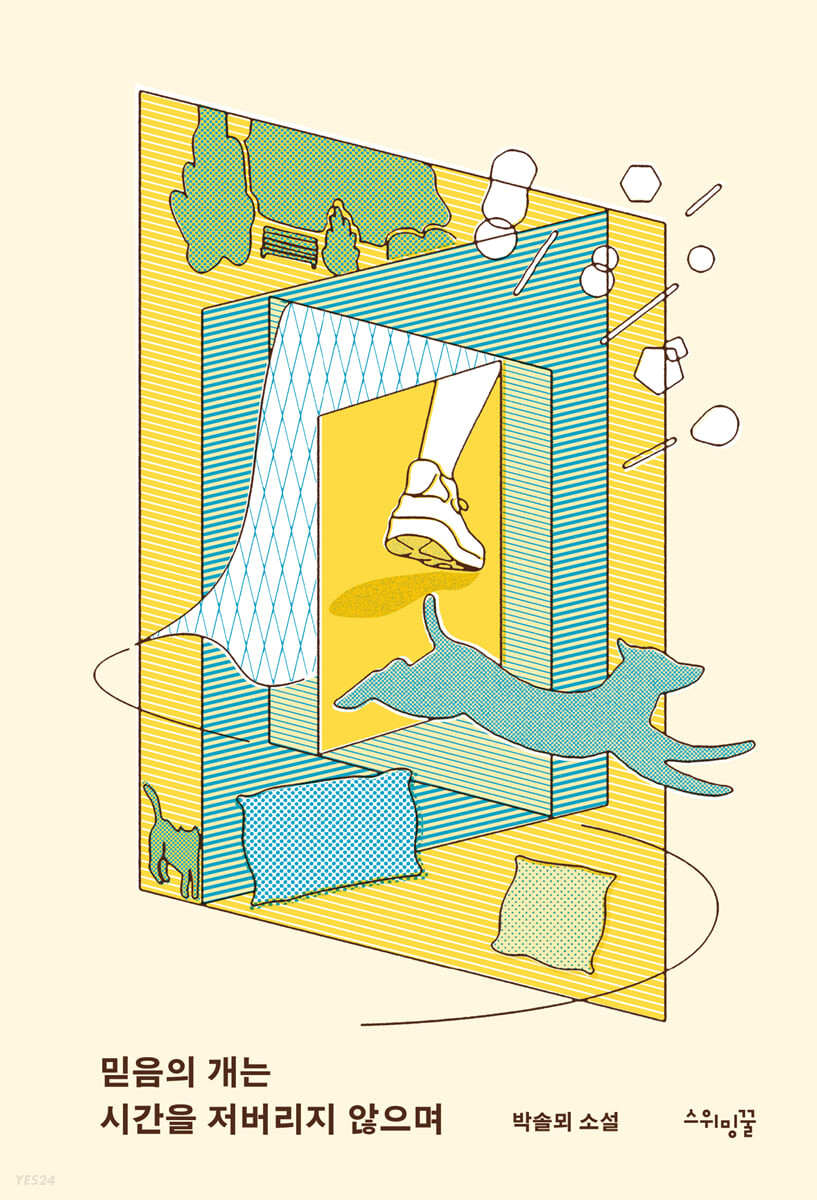
박솔뫼의 소설을 더 찾아 읽고 싶어졌다. 2019년에 단편 <수영하는 사람>을 쓰기 위해 동대문을 찾았고 그때 처음 중부시장을 가보게 됐다는 <극동의 여자 친구들>의 ‘작가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수영하는 사람>이 궁금해 그 글이 수록된 소설 <믿음의 개는 시간을 저버리지 않으며>(스위밍꿀, 2022)를 펼쳤다. 긴밀하기보다는 긴요하게 연결된 여섯 편의 이야기였다. 자발적으로 한 달간 동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무사히 동면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보며 일지를 쓰는 가이드가 있다. 소설의 내용을 더 요약하기란 불가능할 것 같다. 다만 잠에 빠져든 누군가의 가만한 얼굴이 있고, 그 얼굴을 내려다보는 사람이 있으며, 그 낯선 얼굴을 보다가 홀로 산책을 나서는 사람, 그 길에서 우연히 만난 또 다른 가이드, 그 가이드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동면자와 가이드의 이야기가 이어진다고 말하겠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여섯 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나 계속되고 계속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그런 가운데 소설 속 인물들은 각자의 방식과 순간에 각자의 그림자 개와 만날 것이다.
“그림자 개는 시간과 마음의 연결이 약해진 사람들에게 나타나 산책을 요구한다. 물론 그것은 세상의 모든 개가 하는 일과 똑같다. 시간과 마음의 연결이 느슨하고 희미해지면 우리는 시간에 대한 건강한 긴장감을 잃고 증상이 심해지면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된다. 그러기 전 이들에게 그림자 개가 나타나 어김없이 산책을 요구하고 이들과 산책을 하는 동안 사람들은 시간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게 될 실마리를 찾게 된다. 그러므로 이는 시간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나타나는 일종의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자신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에게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만 생각한다. 물론 현실에 존재하는 보통의 개를 만나는 사람들의 반응도 그와 마찬가지이다.”(131~132쪽)
동면, 산책, 그림자 개…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그 끝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눈을 뜨는 것이다. 시간과 마음의 연결이 약해졌던 우리는, 동면, 산책, 그림자 개를 만난 우리는, 다시, 눈을 떠야 한다. 이번 소설의 ‘작가의 말’은 이렇게 끝난다.
“…<사랑하는 개> 작가의 말 마지막에 썼던 말은 다시 쓰고 싶다. ‘내가 앞으로 할 것들과 하지 않고 하지 못할 것들이 늘 언제나 기대가 된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마음이다.”(198쪽)
<사랑하는 개>(스위밍꿀, 2018)를 읽어보고 싶다.
- 포토
- YES24, Pexels
추천기사
인기기사
지금 인기 있는 뷰티 기사
PEOPLE NOW
지금, 보그가 주목하는 인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