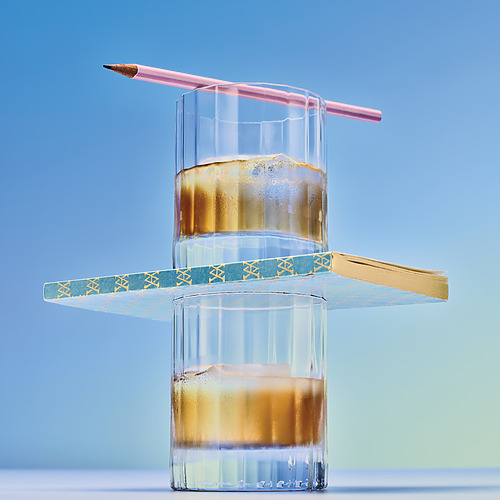위스키를 음미하는 천선란의 단편소설 ‘마지막 한 모금’
웅크리는 계절을 받아들이는 데는 위스키 한잔이 필요하다. 그 곁에 소설이 함께하면 이 순간을 사랑할지 모른다. 위스키를 주제로 〈보그〉에 보내온 김금희, 김연수, 정대건, 천선란, 조해진, 장강명, 편혜영, 김기태 작가의 단편만큼은 과음을 권장한다.

마지막 한 모금
허름할 줄 알았던 ‘비밀의’ 가게는, 풀숲에 숨어 있다는 느낌보다 풀숲을 정원으로 쓰는 것처럼 세련되고 깔끔한 외관이었다. 상상했던 통나무집이나 붉은 벽돌집과는 전혀 다른, 검은색으로 짙게 코팅된-마치 흑조의 깃털 같은-통유리 벽에 곡선의 우아함이 느껴지는 나선형 지붕의 건물, 그리고 건물 주위에 흰 모래밭이 인위적으로 조성되어 있었다. 조이는 모래밭의 검은 돌다리를 건너 입구로 향했다. 이럴 때마다 어김없이 시니의 말이 떠올랐다. 조이에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던, 조이를 가둔 상자의 뚜껑을 열어야 한다던. 진중한 말 같겠지만 시니가 그런 말을 할 때는 언제나 자신이 술 마시는 이유를 정당화하기 위해서였다. 술로 인식을 깨트린다는, 다분히 주정뱅이 같은 말이었다.
조이는 술을 즐기지 않았다. 알코올을 해독하는 몸의 기능이 부족한 것인지, 시니랑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다음 날 죽어가는 건 조이뿐이었고, 그것이 억울해 어느 순간부터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 술을 마시지 않는 건 쉬웠다. 애당초 조이는 기분 좋게-아주 잠시지만-취한다는 이점 외에 술을 마시는 이유를 찾지 못했다. 물보다 술이 더 저렴해진 시대다. 1세기 전에는 술의 종류가 몇백 가지가 될 정도로 다양했다지만, 이제 술은 화학의 산물일 뿐이었다. 인간이 마실 수 있게 만든 알코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술이 가지고 있던 낭만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술을 마셨다. 술이 물보다 저렴한 것도 이유일 것이다. 완전히 정화된 정제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술에는 늘 불순물이 떠 있었고, 그건 조이가 술을 멀리한 이유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시니는 술잔을 천천히 기울여 마시며 허풍을 떨었다.
“위스키라 생각하는 거지.”
조이는 시니의 말을 잔인하게 받아쳤다.
“하지만 너는 위스키를 마셔본 적도, 본 적도 없잖아. 위스키를 만들 만큼 곡물이 충분히 자라지 않으니까.”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며 과일과 곡물은 점점 희귀해졌다. 그중 포도가 제일 먼저 사라졌다. 한때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은 포도밭이었다던 땅들은 전부 사막이 되었다. 포도를 지키기 위한 그 나라 사람들의 숱한 노력에도 포도의 멸종은 막지 못했다. 인류의 긴 역사를 함께한, 신의 피라 여겨지기도 했던 술 이상의 의미가 있던 검붉은 발효주는 그렇게 사라졌다. 기록에 의하면 그렇다. 가장 늦게 사라진 것은 감자로 만든 위스키였다. 시니가 한 세대만 더 일찍 태어났다면 위스키를 맛볼 수 있었을 텐데.
조이가 입구 앞에 서자마자 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안에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다. 냉방기를 틀어놓은 듯한 한기가 느껴졌다. 조이가 맨살이 드러난 팔을 끌어안으며 지하로 내려갔다. 시니는 지난해 세상을 떠났다. 지병을 앓고 있었다. 유전병이었다. 술을 물처럼 마셔서 얻은 병이 아니라는 것에 시니는 만족했다. 술이 그렇게 좋으냐고 물었다.
“단지 알코올을 들이마신 게 아니고 낭만과 고독을 마신 거야. 소원을 못 풀고 가는 게 한이야.”
“소원이 뭔데?”
“위스키를 마셔보는 거.”
지하에는 위스키 잔 모양의 네온사인 간판이 홀로 빛나고 있었다. 이번에는 문이 자동으로 열리지 않아, 초인종을 눌렀다. 검은 코트를 입은 직원이 나와 조이를 바 테이블로 안내했다.
바 테이블에는 조이를 제외하고 몇 사람이 더 있었지만, 조명이 어두워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조이가 직원에게 물었다.
“아직 남은 위스키가 있다고 들었는데···.”
직원이 창고 안으로 들어가더니, 위스키 잔을 들고 나왔다. 잔의 절반 정도 담긴 위스키는, 시니의 말대로 투명했다.
“마지막 잔입니다.”
조이가 한동안 마시지 않고 바라보고만 있자, 직원이 물었다.
“왜 안 드십니까?”
“한 모금 정도네요.”
“위스키는 독주입니다. 밖에서 파는 가짜 술과는 차원이 다르죠. 한 모금이어도 충분해요.”
“사실 저는 술맛을 잘 몰라요. 묵힌 술을 마실 용기도 없고요. 그냥 애인의 소원이라 왔어요. 어디서 아직 숙성 중인 위스키가 있다고 듣고 와서···. 근데 진짜 있네요. 문제는 지금 제가 이게 진짜 위스키가 맞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위스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걸 줘도 저는 모르잖아요.”
“당신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는 이제 위스키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으니, 문제없지 않습니까. 당신이 느낀 대로 말하는 것이 위스키가 될 것입니다.”
직원의 말을 듣던 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위스키를 마셨다. 불에 달군 돌을 삼킨 듯한 감각이 느껴졌다.
“나쁘지 않네요.”
조이가 말했다.
“제가 말하는 게 다 사실이 된다는 거. 달콤하네요.” 천선란 천선란은 안양예술고등학교와 단국대학교에서 문예창작을 공부했다. 대표작 <천 개의 파랑>으로 2019년 제4회 한국과학문학상 대상을 수상하기 전 웹소설 플랫폼 ‘브릿G’에서 <무너진 다리>로 SF 부문 1위를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다.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SF 소설로 마니아층을 형성했으며 <나인>, <노랜드>, <랑과 나의 사막>, <이끼숲> 등을 썼다. 이 외에도 다양한 앤솔러지와 매거진에 기고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최근 만화광의 면모를 드러낸 산문집 <아무튼, 디지몬>을 출간했다. (VK)
관련기사
-

아트
위스키를 음미하는 김금희의 단편소설 ‘주종의 이해’
2024.10.24by 김나랑, 류가영
-

아트
위스키를 음미하는 김기태의 단편소설 ‘꼭 그렇진 않았다’
2024.10.24by 김나랑, 류가영
-

아트
위스키를 음미하는 김연수의 단편소설 ‘내 앞의 세계를 바꾸는 방법’
2024.10.24by 김나랑, 류가영
-

아트
위스키를 음미하는 장강명의 단편소설 ‘인어공주 옆에서’
2024.10.24by 김나랑, 류가영
-

아트
위스키를 음미하는 정대건의 단편소설 ‘각자의 술잔’
2024.10.24by 김나랑, 류가영
-

아트
위스키를 음미하는 조해진의 단편소설 ‘PASSPORT’
2024.10.24by 김나랑, 류가영
-

아트
위스키를 음미하는 편혜영의 단편소설 ‘그 골목의 향기’
2024.10.24by 김나랑, 류가영
추천기사
인기기사
지금 인기 있는 뷰티 기사
PEOPLE NOW
지금, 보그가 주목하는 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