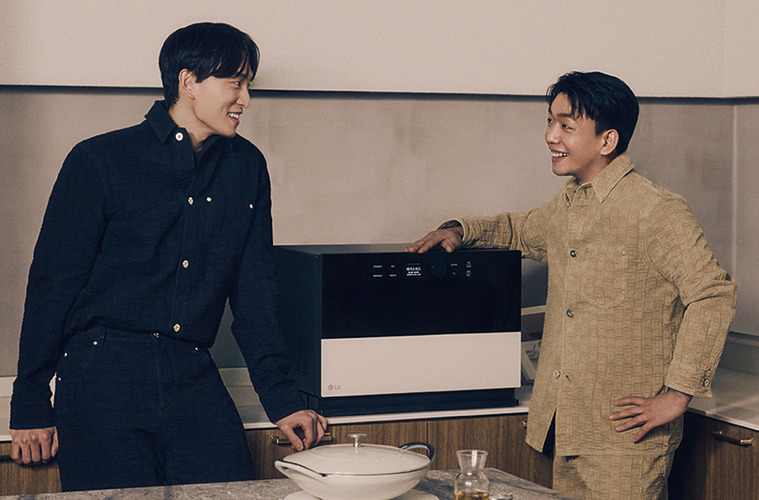치열함, 그 잃어버린 낭만에 대하여
나를 갈아 넣으려는 사회에 반기를 들며 적당한 타협과 효율을 추구해왔다. 하지만 디테일의 끝판으로 완성한, 거의 무용에 가까운 작품을 보며 잃어버린 낭만을 떠올렸다.

작은 것들의 신
아직은 따뜻한 9월의 베니스, 선착장에서 보트를 기다리고 있었다. 과거 베네딕트 수도원이었던 폰다치오네 조르지오 치니에서 열리는 공예 비엔날레 ‘호모 파베르(Homo Faber)’를 보기 위해서다. 런던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던 중 급히 잡은 1박 2일 일정이었다. 그만큼 큰 기대 없이 ‘공예가 공예겠지’가 솔직한 심경이었다.
이 비엔날레는 <콜 미 바이 유어 네임>, <아이 엠 러브>를 연출한 루카 구아다니노가 공동 예술감독을 맡아 화제였지만, 스타 감독과는 별개로 ‘디테일의 끝판’을 보여주는 장인 400여 명이 진짜 주인공이었다.
새끼손톱만 한 황동 꽃 3,000개를 이어 붙인 항아리(고혜정의 ‘The Wishes’)를 보고 울컥했다. 여독으로 감정적인가 싶지만, 치열하지 않은 내 삶에 대한 죄책감이 올라온 거 같다. 전시작이 대부분 그런 식이었다. 만든 이의 시력과 손목이 무사하지 못할 아주 작은 디테일의 집합체.
전시는 인생의 여정으로 파트가 나뉘었다. 첫 번째 ‘출생(Birth)’은 이탈리아 전통 보드게임인 ‘거위 게임(Goose Game)’을 각 나라 장인들이 재구성했다. 궁중 자수를 한 땀 한 땀 수놓은 조희화 작가는 하루 20시간 작업한다. 잘못 들은 줄 알고 되물었다. 20시간이요? “일상생활은 거의 못한다고 봐야죠”라고 큐레이터가 답했다.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이 ‘출생’ 파트에 거위 게임을 등장시킨 이유는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어떤 운명이 주어질지 모르는 인생을 말하고 싶어서였다. 마음대로 결과를 만들 수 없는 이 게임에서 나는 어떻게 주사위를 던지는가. 혹은 던져진 주사위의 자리에 어떤 자수를 놓고 있는가. 효율과 효능이 우선하는 시대에 솔직히 나는 시간, 노력과 타협하며 그 속도에 따라가고 있다. 또한 몇몇 유튜브 콘텐츠를 보면서 든 생각인데, 요즘은 거칠고 정제되지 않은 ‘순간’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오히려 추구한다. 그것의 미덕이 있지만 혹시 ‘얻어걸리는 순간’을 기대하며 방만한 태도로 살아가진 않는가.
적어도 나는 점점 그렇게 되어간다. 그렇지 않은 한 현장은 알레산드로 미켈레의 발렌티노 2025 봄/여름 컬렉션이었다. 그가 발렌티노로 옮기고 처음 선보이는 런웨이 패션쇼. 쇼장에 들어선 <보그> 편집장은 유령처럼 흰 천으로 덮인 의자에 허리를 숙이고 뭔가 살피고 있었다. Da24, DA40-A 등 각기 다르게 찍힌 도장이었다. 막내 에디터는 편집장에게 “이런 게 보이시는군요”라고 했고, 편집장은 “이런 걸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작은 것이 큰 차이다. 캡션 한 줄도 식상하지 않게 써야 한다. 수년 전에 선배들이 한 말이지만 잊고 지냈다. 열정을 강요하는 시대에 반기를 들어오면서 그 조언은 다소 폭력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했으니까. 당시에도 속으로 “그럼 일을 줄여주든가요”라고 중얼거렸다. 심지어 나의 후배에게는 “이거 다 열정으로 하다가는 네가 죽는다. 영혼을 뺄 기사와 넣을 기사를 구분하라”고 했다.
인간을 쥐어짜내는 이 사회생활에서 뭐가 맞는지는 아직 헷갈리지만, 이제 나는 디테일에 천착하고 싶어졌다. 내가 혹시 이미 기득권이 되어서 업무량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디테일 타령을 하는 걸까.
그때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을 만났다. 신작 <클라우드>와 <뱀의 길>을 선보였는데, 스스로를 “69세임에도 한 해에 두 편을 만드는 이상한 감독”이라 말하면서 웃었다. 거장들이 그러하듯이, 그에게 조금의 거만함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가 마지막에 언급한 360도 이론을 휴대폰 메모장에 적었다. “제 작품의 디테일을 360도 면밀히 뜯어보지만 100% 만족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평생 360도로 빙글빙글 돌다가 끝날 거 같습니다.” 그는 180도에 만족하지 않는다. 남들에게 보이는 평면을 적당히 마무리하지 않고, 타협 없이 뺑뺑이를 돌기에 여전히 이름이 불린다. 스스로는 무척 괴롭겠지만.
치열함이라기보단 잃어버린 낭만이라 부르고 싶다. 360도 멀미가 날 때까지 눈을 비비며 뜯어보는 낭만. 본래 낭만은 효율성과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이 다짐은 갑자기 추워진 부산 날씨와 오뎅 바에서 걸친 술 때문에 급격히 잊혔다. 다시 상기한 때는 10월 9일 개막한 프리즈 런던에 출장을 가면서다. 같은 시기 런던 헤이워드 갤러리에서 양혜규 작가의 25년 여정을 망라한 전시 <윤년>이 열렸다. 작가라면 감격스러울 법하지만 양혜규는 특유의 덤덤한 표정으로 들어섰다. 지하 회의실에서 기자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가 한 대답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 들었다. 질문은 AI 시대에 직접 작품 활동을 하지 않는 작가까지 등장한다는 거였는데, 양혜규 작가는 디지털 벽면 프린팅 작업을 이야기했다. “이 작품을 프린트하기 위한 데이터의 양이 ‘어마무시’했어요. 상당히 노동 집약적인 작업이었죠. 3D 프린팅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발생하는 오류를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엔트로피 안에 살고 있고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흔히 말하는 고급 예술은 엄청난 자본과 인력이 폭발해 나오는 혁신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유닛(Unit)’들이 극한으로 치달아 보여주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해요.”
영어 사전에 ‘Unit’을 검색했다. 1 구성 단위, 2 (상품의) 한 개, 3 (특정 임무를 위한) 부대, 4 (계량) 단위 등이 뜬다. 결국 예술이란 개인을 철저히 끝까지 몰고 가는 싸움이란 의미인가. 내가 가끔 접속하는 챗GPT든, 그럴 리 없지만 내게 쏟아지는 자본과 막강한 서브 인력이든 관계없이 내 수고가 전부다. 양혜규 작가는 이렇게 덧붙였다. “저는 결과보다도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정에 대한 만족감이 큽니다.”
다음 날 나는 화이트 큐브 버몬지에서 열리는 트레이시 에민 개인전에 갔다. 작품 속 인물들의 이목구비는 흐릿했고 다른 선 또한 단순하고도 거칠었다. 한 관람객이 큐레이터에게 질문했다. “왜 얼굴이 뭉개져 있나요?” 큐레이터는 에민을 대변할 수 없지만 이렇게 추론했다. “에민 작가는 작업할 때 울거나 비명을 지를 만큼 감정을 폭발시키기 때문일 거예요.” 언뜻 작업 과정이 즉흥적으로 들리지만, 그녀는 회화 한 점을 수년에 걸쳐 완성한다. 그림을 하얀 물감으로 덮어버리고 다시 그리기를 반복한다. 그때마다 감정은 다시 폭발하고, 이 반복이 언제 끝날지는 그녀만이 결정한다. 어떻게 매번 끊임없이 치열할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전시 오프닝 파티에 양 갈래로 머리를 땋은 트레이시 에민이 지인들과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이 소녀 같았지만 그녀가 홀로 캔버스 앞에서 울부짖으며 작업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곁에 갈 수 없었다. 물론 그녀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기도 했지만.
써놓고 보니 최근 한 달이 디테일의 장인들을 찾아나선 여정 같다. 하지만 내가 디테일의 힘을 인식한 순간, 그러니까 3,000개의 꽃 작품에서 울컥하고 나서야 그런 인물들이 눈에 들어왔을지도 모른다. 한 끗 차이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갈아 넣는 이들은 거장 감독이나 아티스트가 아니라도, 주변에 많을 거다. 나도 이 글의 아티잔이 되고 싶지만 오늘 일정이 많다. 경기도에 사느라 퇴근에만 1시간 30분이 걸릴 것이다. 이런 핑계로 내 수준은 제자리걸음이다. 깊어지려면 디테일은 필수인데 말이다. (VK)
추천기사
인기기사
지금 인기 있는 뷰티 기사
PEOPLE NOW
지금, 보그가 주목하는 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