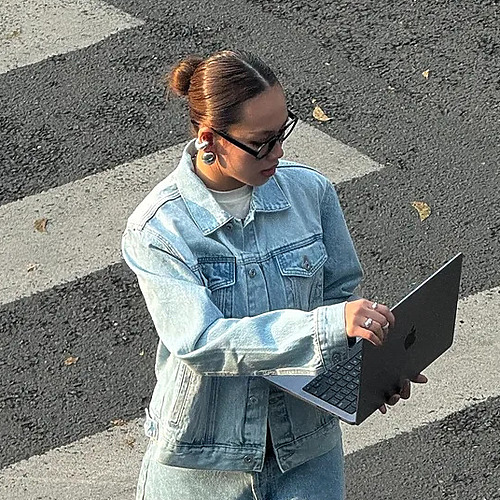우울: 공적 감정
우울은 내게도 오래되고 익숙한 감정이고 연속적인 감정의 타래다. 어느 날은 우울감에 사로잡혀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 때가 있다. 그럴 때면 자제력을 잃고 스스로를 괴롭힌다. 모든 게 귀찮고 한없이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우울이라는 감정이 돌연히 내 앞에 나타난다고 여기던 때도 있었다. 그런데, 아니었다. 가만히 돌아보니 이유 없는 우울은 없었다. 분명 뭔가가 나를 자극하고 괴롭혔다.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나는 교착상태에 빠진 것이다. 우울은 분명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이지만, 그 감정을 촉발한 것은 나의 외부였다. 일, 사람, 사건이라는 외부. 우울에는 외부가 있다. 다시 말하면, 우울은 개인의 외측과 깊숙이 연루된 것이다. 우울을 개인의 몸 안쪽에서 일어나는 감정 작용으로만 국한한다면, 누군가는 그것을 병리적, 유전적인 접근으로, 개별 심리적 문제로 한정 지으려 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몸 바깥, 외부는 이해받지 못하거나 몸 안쪽과의 관계는 금세 삭제되고 만다.

앤 츠베트코비치의 <우울: 공적 감정>(마티, 2025)은 우울이야말로 이 시대의 일상적인 느낌이고 경험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또한 우울을 공적인 느낌이라고 말하며 그 느낌을 정치화하는 작업에 골몰한다. 여성학, 젠더, 섹슈얼리티 연구자인 저자는 2000년대 초반 ‘퍼블릭 필링스’라는 프로젝트를 결성해 감정을 정치적 분석의 중요한 대상으로 삼았다. 감정 또는 느낌이야말로 연구의 주제이자 방법이며 그것을 통해 새로운 비평적 실천을 시도한다. 특히 수치심, 실패, 멜랑콜리, 우울 같은 이른바 ‘부정적인 느낌’이라고 치부되는 것에 주목하고 그런 느낌에 덧씌워진 병리의 역사를 탈병리화한다. 그런 다음 이른바 ‘긍정적인 느낌’으로 여겨지는 유토피아, 희망, 행복 같은 것이 실은 ‘부정적 느낌’과 뒤엉켜 있으며 심지어 ‘부정적 느낌’에 의해 촉진된다는 것을 재사유한다. 우울을 생물학적이거나 의학적인 현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현상으로 접근해나간다.
“우울은 망가질 때까지 확장되는 육신의 형태가 아니라, 절망과 체념으로 서서히 쪼그라드는 정신과 삶이라는, 훨씬 더 비가시적인 폭력의 형태를 띤다. 이런 느낌을 포착하려면 새로운 개념 범주뿐 아니라 참신한 묘사와 기술 방식이 필요하다.”(37쪽)

그리하여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크게 두 가지 형식의 글쓰기 방식을 시도한다. 1부는 우울에 관한 저자의 경험이 담긴 회고록이고, 2부는 앞서 말한 퍼블릭 필링스 프로젝트를 통해 우울에 관한 지적 지도와 실천적 수행에 관한 에세이다. 우울을 둘러싼 학술적 기술이 아니라 개인적 글쓰기라고 언급되는 회고록과 에세이 형식을 취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라는 1970년대 페미니즘의 중요 담론의 가치를 이어받는 동시에 소위 고백 담론을 겨냥한 비판(이를테면 너무 사사롭다는 식의 그것)에 주눅 들지 않는 동시대 젊은 세대 페미니스트들의 존재와 영향 덕분이다. 회고록이 자신의 연구 방법으로 기능한다고 생각한 또 다른 이유는 ‘회고록에서 감정, 그리고 삶에서 체험한 것들이 학문의 훈련 및 비평과 충돌하는 지점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충돌들이 학자들과 활동가가 느끼는 정치적 우울의 원인 중 하나이며 개인적 서사를 쓰는 작업이 학문적, 지적 분석에서 금기시하며 차단하는 직감과 느낌들을 독려한다”(154쪽)고 느끼기 때문이다. 회고록, 에세이와 같은 ‘과정 기반의 제약 없는 글쓰기’를 통해 개인의 구체적인 감정 경험을 무시하지 않고 되레 더 잘 포착할 수 있으며 그것을 시작점 삼아 우울감이 어떻게 현재의 삶과 사회에 영향을 받고 공적 감정으로 작동하는지를 살펴나간다. 우울을 공적 감정으로 인지하고 인정하고 인식할 때 우울을 통해 다른 가능성, 어쩌면 회복이라고 할 수 있는 힘, 정치적 에너지를 찾을 수 있다.
이 책은 개별적인 동시에 공적인 우울에 관한 수행적이고 실천적인 연구이자 정치적 제안이다. 나의 우울이 나를 고립시키는 게 아니라 이 우울의 공적 출처와 공적 역사를 통해 창의적 공간과 힘을 모색하려는 시도다.

끈질기고 만성적이며 계속되는 우울감 앞에서 쉬이 낙담할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나는 다시 우울의 외측, 외부를 떠올린다. 오직 나로 수렴되는 감정이나 나를 탓하는 감정이 아니라 관계로서의 감정, 공적 감정으로서의 그것. 우울의 시대에 우울에 사로잡히지 않을, 잡아먹히지 않을 방도가 필요하다.
- 포토
- Yes24, Unsplash
추천기사
인기기사
지금 인기 있는 뷰티 기사
PEOPLE NOW
지금, 보그가 주목하는 인물